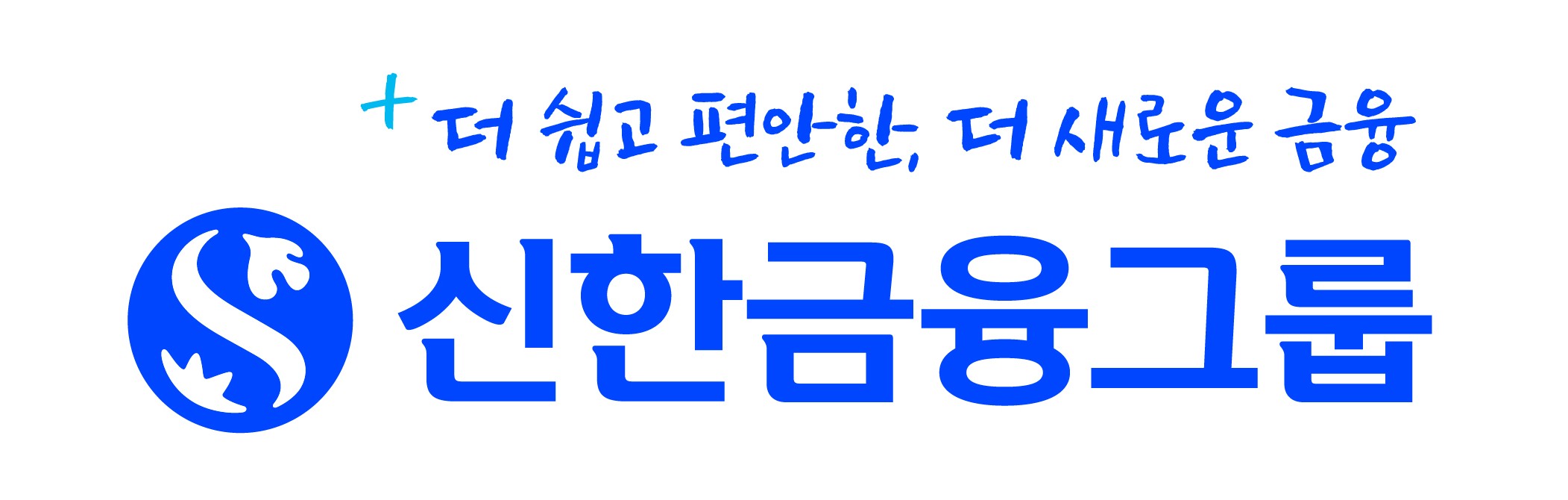![실업급여.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5/art_17384579431683_3a4743.png)
【 청년일보 】 지난해 137만명이 넘는 이들이 직장 폐업,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원치 않게 일자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0만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비자발적 실업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는 137만2천9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0만6천761명(8.4%) 증가한 수준으로, 전체 퇴직자의 42.9%를 차지했다. 퇴직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비자발적 실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경기 둔화와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9년 132만9천927명이던 비자발적 실업자는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180만6천967명까지 급증한 뒤, 2021년 169만3천825명, 2022년 129만8천454명, 2023년 126만6천191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노동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의 질도 악화되는 모습이다. 일주일에 18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5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2023년 226만8천명에서 지난해 23만2천명(10.2%) 증가한 것이다.
또한,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88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0.8%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 3명 중 1명이 단시간 근로자인 셈이다.
반면, 장시간 근로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주 53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2023년 32만7천명(10.7%)에서 274만1천명으로 줄었다. 이는 플랫폼 경제 확산과 함께 배달·운송업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근무 형태가 유연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줄이고 경력직 위주의 수시채용을 확대하는 것도 노동 시장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까지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