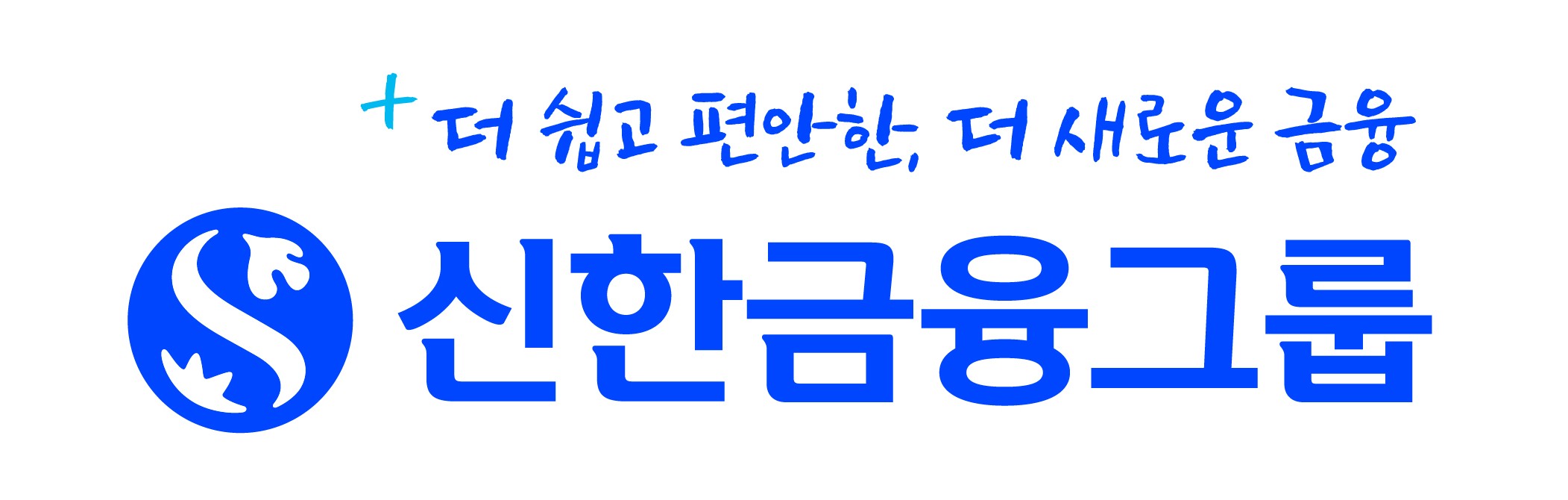![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1706313837_863112.jpg)
【 청년일보 】 지난해 12월 서울의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전월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이후 수년째 1천건대에 육박하는 수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특정 구에서만 미분양이 증가하며 상급지와 비(非) 상급지 간 양극화 우려를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분양시장의 지방과 수도권간 격차도 심화돼 전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다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서울 미분양 또 증가…양극화 우려 심화
11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미분양 주택은 957건로 전월(931건)에 비해 2.8% 늘었다.
서울 미분양은 지난 2021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54건에 불과했으나 금리인상이 본격화된 2022년 말 기준 994건으로 폭증한 이후 줄곧 9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52건에 그쳤던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2년 340건으로 세자리수를 기록한 후 2023년 461건, 지난해 말 기준 633건으로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12월 서울의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은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총 66건)에서만 38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구로구 미분양 주택수의 증가는 지난 2023년 9월 분양을 승인받은 '호반써빗개봉'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봉동에 위치한 이 신축 단지는 지난해 11월 자료에는 미분양 주택수로 합산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12월 준공승인을 받으면서 당시 39건의 준공 후 미분양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달 84㎡ 평형대 16가구에 대한 임의공급 청약접수를 진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호반써빗개봉엔 수천만원대의 마이너스피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강북구(-4건), 도봉구(-3건), 강동구(-3건), 금천구(-2건)는 미분양이 줄었고, 다른 구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다만, 강동구(300건), 동대문구(170건), 강서구(145건)은 지난해 12월 기준 여전히 세자리수 미분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 구로구 외 강북구(66건), 광진구(57건), 마포구(55건) 등 순으로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의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 가구수는 타 지역에 비해 많지 않지만, 지난 2022년 급증한 이후 변동이 거의 없어 만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은 수개월째 미분양 '제로' 상태다.
올해 첫 강남권 분양 단지로 주목받은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난 5일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268세대 모집에 총 4만635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151.6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전 타입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됐다.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로 84㎡ 평평 기준 24억5천만원을 뛰어넘는 초고분양가에도 불구, 주변 시세 대비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며 청약통장이 많이 몰렸다.
이 외에도 강남권 청약은 서울 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여전히 '불패'로 여겨지며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 수도권 vs 지방 온도차 '여전'…업계 "파격대책 절실"
이같은 서울 내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시장 온도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원페를라 청약과 같은 날 울산과 광주에서 분양을 실시한 2개 단지는 각각 328가구 모집에 15건, 111가구 모집에 19건만이 접수되며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아울러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173가구 중 지방 미분양(5만3천176가구)은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전체 미분양 가구 4채 중 3채가 지방에 몰려있는 셈이다.
수도권 미분양은 12월 말 기준 전월에 비해 17.3%(2천503가구) 증가했지만, 미분양 가구 수(1만6천997가구)자체는 지방이 압도적이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수도권이 전월과 비교해 409가구가 늘며 10.6% 증가한 반면, 지방은 무려 2천427가구가 추가되며 16.4% 증가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해지자 여당은 지난 4일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초점을 맞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 카드를 빼들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린다'는 원칙이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여당의 이러한 요청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 내에서도 대출 규제로 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지난 2013년 정부는 현재와 같이 악성 미분양이 2만채를 넘기자 9억원 이하 신규 분양 주택, 미분양 주택,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강남권을 비롯해 일부 인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사비가 오르고 대출이 막혀있어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파격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