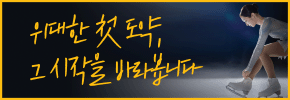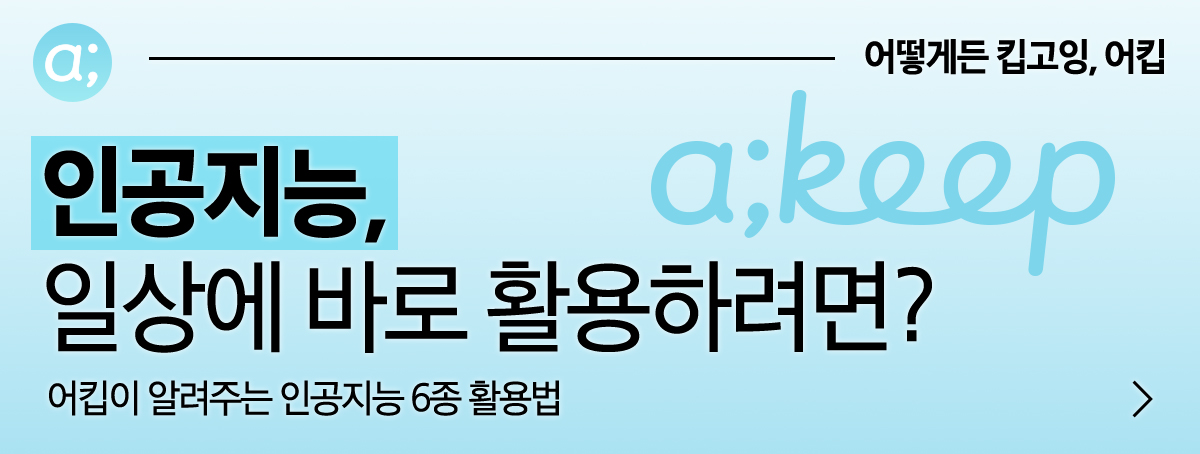![인공지능(AI)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28/art_17519320726068_6e7267.png)
【 청년일보 】 국내 연구자들이 지난해 발표한 생물의학 논문 가운데 약 5편 중 1편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영어권 국가의 활용률이 영어권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학술지의 신뢰도에 따라 AI 사용 비율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독일 튀빙겐대 드미트리 코박 박사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천500만여 건의 생물의학 논문 초록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전체의 13.5%가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정황을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 '펍메드(PubMed)'에 등록된 논문 초록에서 'delves', 'underscores', 'potential', 'findings' 등 LLM이 선호하는 표현의 빈도 변화를 통해 AI 사용 여부를 추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LLM 사용 비율을 연도별·국가별·학술지별로 세분화해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한국, 중국, 대만 등 비영어권 국가에서 LLM 사용률이 약 20%로, 영국·호주 등 영어권 국가(약 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비영어권 연구자들이 영어 교정 도구로 LLM을 실용적으로 활용한 반면, 영어권은 AI 문구를 자연스럽게 재작성해 흔적이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학술지별로는 네이처, 사이언스, 셀 등 최상위 저널에 실린 논문 중 AI 흔적이 있는 경우는 7%에 불과했지만, 스위스의 상업출판사 MDPI 계열 저널은 최대 21%까지 치솟았다. 특히 MDPI의 대표 학술지 '센서스(Sensors)'에 실린 한국 논문은 34%가량이 AI 사용 정황을 보여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LLM이 생물의학 분야 논문에 준 영향이 코로나19 출현보다도 크다며 이런 추세를 볼 때 과학 논문에 LLM을 사용하는 데 대한 정책과 규정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의 논문 활용에 대한 학계의 제도적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전 세계 연구자 5천2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AI로 논문을 편집하거나 번역하는 것에 긍정적이지만, AI 사용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는 55%에 달했다.
논문 초록에는 AI 사용을 허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다수였지만, 실제로 AI를 써 본 연구자는 전체의 28%에 불과해 여전히 보수적인 분위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