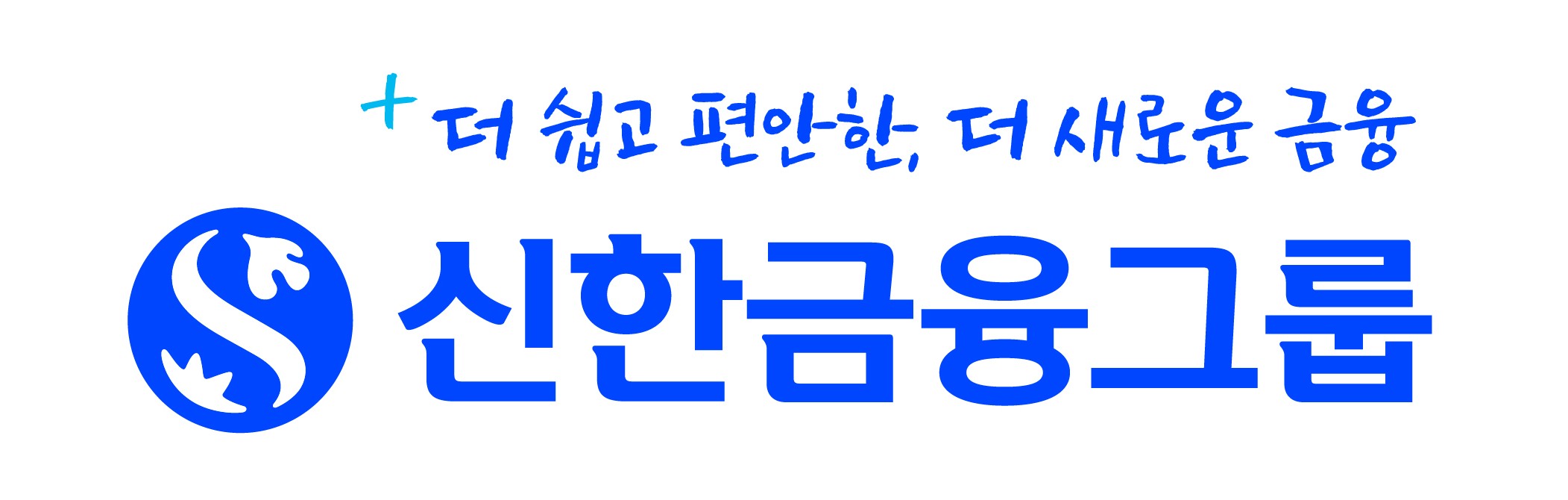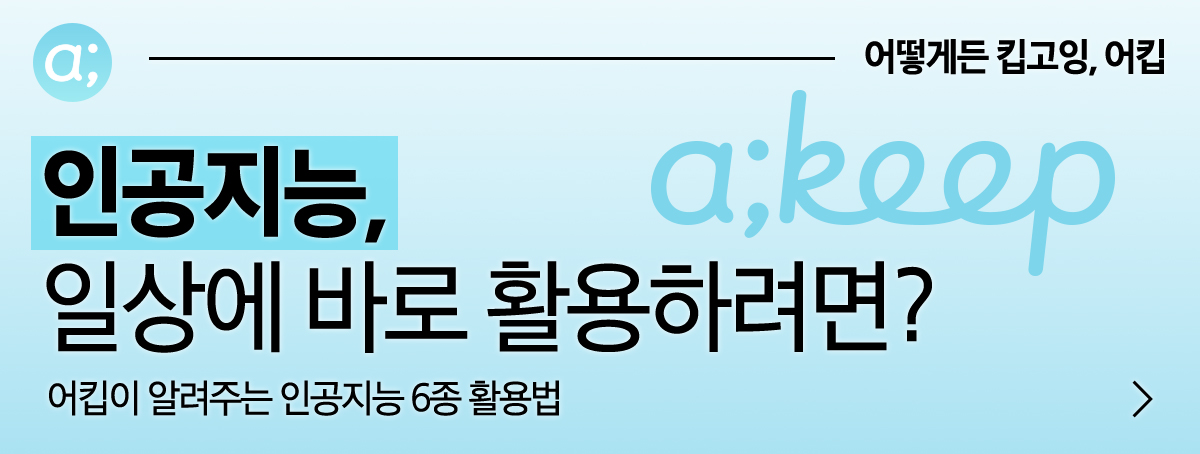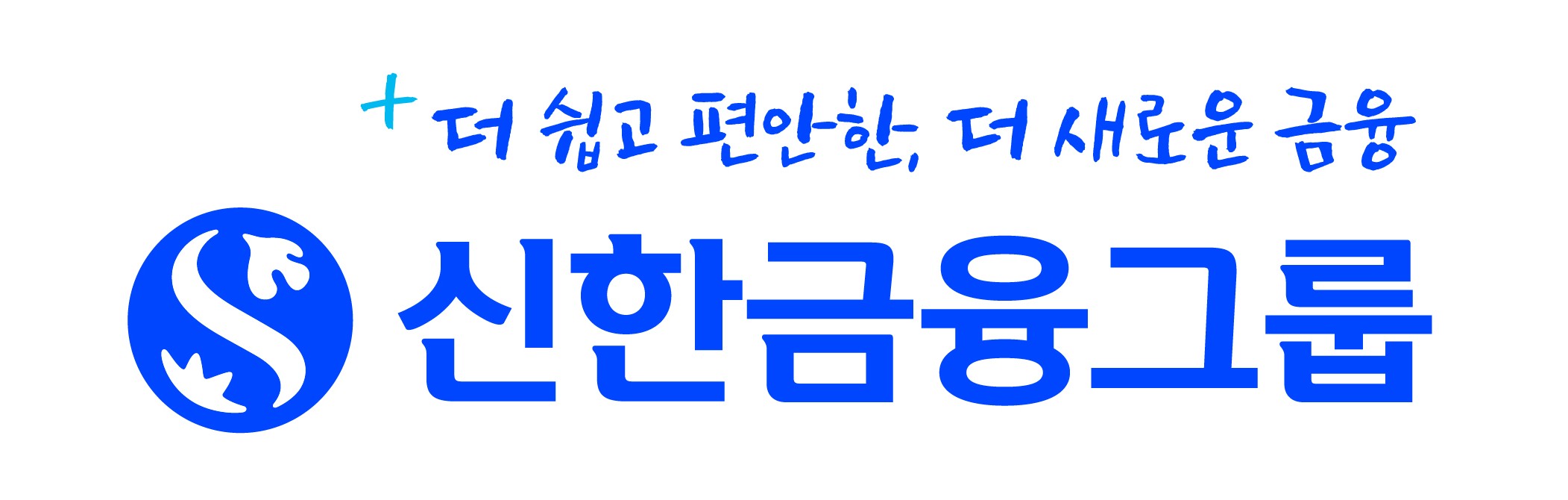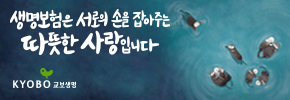![청년서포터즈 8기 박지은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30/art_17533423134531_525d25.jpg)
【 청년일보 】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삶의 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지듯 건강상태 또한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화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교육이 짧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건강 행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적으며 건강에 유해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건강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더 건강하지 못한 건강 격차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사회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과제이다.
인구 고령화와 지방 인구의 감수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 격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 또한 활발하다. 의료와 건강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의료 자원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이의 건강 수준이나 건강 행동 실천율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 볼 수 있는 ‘불평등’이 아닌, 사회적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불형평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의료는 기본권이기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에 투입되는 재정도 개선하면서 동시에 지역 사회 의료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다만 형평성을 위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도 안 되며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공정한 공급 시스템이라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
기존 의료체계를 그대로 두고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체계를 네트워크 기반의 협력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병원 중심의 의료 서비스에서 나아가 집과 지역 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때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박지은 】